【에이블뉴스 김영아 칼럼니스트】얼마전, 장애인 형제자매를 두고 있는 '비장애 형제자매 청년 인터뷰집' <그래도 행복해지고 싶다> 를 우연히 읽게 되었다. 5명의 청년들이 자신의 성장과정과 미래계획에 '장애가 있는 형제자매' 가 얼마나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지 생생하게 보여주는 내용이었다. 장애인복지 현장에 오래 근무하다보니, 동료 중에도 형제자매나 부모의 장애로 인해 이 분야에 관심을 갖게 되어 시작하는 사례를 자주 접하곤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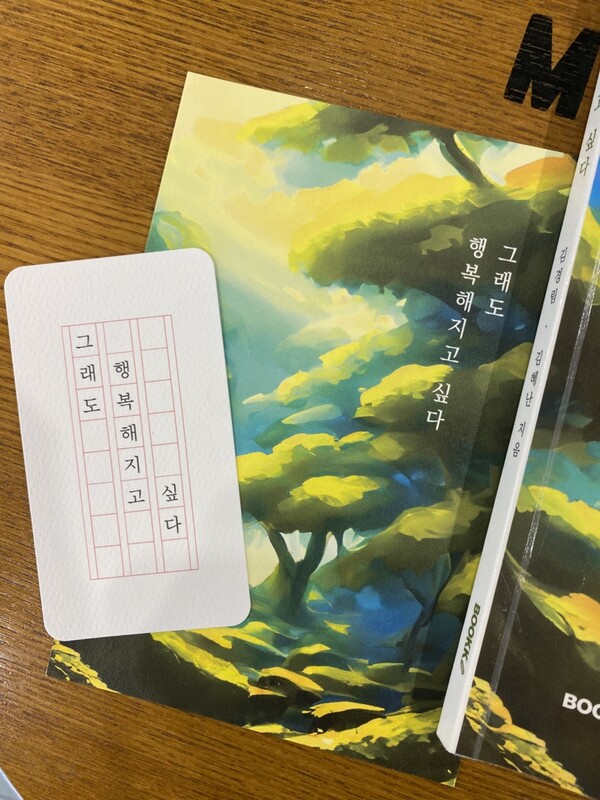
'비장애 형제자매 청년 인터뷰집' . ©김영아
가족돌봄청년(영케어러)을 주제로 다룬 한 학술논문에서는 우리나라 비장애형제자매의 가족돌봄 시작 연령이 9세 라는 보고가 있었다. 이 책에서도 많은 인터뷰이(형제자매)가 말하기를, 학교에 입학하고 다니는 시점부터 형제자매에 대한 돌봄이 시작됐다고 한다. 등굣길에 보이는 초등학교 2-3학년 아이들이 돌봄을 시작해야 한다니 누구라도 마음이 편치 않은 장면이다.
발달장애인의 가족사별과 죽음준비에 대한 다양한 학습을 진행하면서 많은 부모님과 현장 실무자들은 부모 사후 당사자의 돌봄이 형제자매의 몫이 될 수 밖에 없음을 말한다. 물론, 비장애형제자매들 스스로도 자신의 몫으로 여기고 있기에 자신의 꿈, 미래 보다 형제자매의 돌봄이 우선시 되는 경우도 많다.
2024년 진행한 발달장애인 사별, 죽음준비에 대한 설문조사에서도 조사 참여자 70%가 비장애형제자매였다. 이들은 발달장애인의 사별준비와 죽음교육에 대한 욕구를 절대적으로 높게 표명하였는데, 그 이유인즉슨 본인 스스로 부담을 크게 느끼기 때문이었다. 자신의 어깨에 짊어진 벽돌을 누군가 1-2장이라도 덜어주길 바라는 건 당연한 이치일테다. 이들은 부모사후 '나도 부모잃은 자식' 으로서 상실과 애도의 시간을 가져야 하지만, 장애있는 형제자매에 대한 걱정이 자신의 감정돌봄보다 앞설 수 밖에 없다.
<그래도 행복해지고 싶다> 라는 책에 인터뷰이로 참여한 형제자매의 이야기 중 일관된 요구가 하나 있었는데, 비슷한 상황에 있는 비장애형제자매의 모임과 지원이 많아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들은 성인이 된 이후에도 자신의 형제자매가 장애가 있다는 말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는 이들의 삶을 '사회적 문제'가 아닌 '개인의 삶 ' 으로 치부하게 만드는 한계로 작용했다.
나와 비슷한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어딘가에 있다, 이건 나만 겪는 일은 아니다라는 것이 증명될 때 집단이 결성되고 힘이 실린다. 누군가에게 어려움을 호소하고, 지원을 요청할 힘이 생기는 것이다.
전 세계적으로 비장애형제자매의 지원이 가장 활발한 나라는 미국이다. 국가에서 제도적인 지원을 하는 경우는 아직까지 전무하지만 미국은 Sibling Support Project라는 비장애형제자매 지원을 위한 사단법인이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다. 주로 학령기 아동 대상, 교육과 워크샵을 운영하며, 성인기 비장애형제자매를 위한 자조모임도 함께 운영 중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학령기 비장애형제자매를 위한 별도의 모임, 교육과정이 지역 내 장애인복지관, 장애인부모회,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등에서 소규로모 진행되고 있다. 또한, 비장애형제자매 자조모임 '나는' 처럼 전국단위의 정신적장애인의 비장애형제자매 모임이 운영되고 있다.
장애인의 고령화, 노후문제가 심각한 상황이지만 뾰족한 대응이나 정책은 더디기만 하다. 이런 상황은 결과적으로 장애인의 노후문제가 형제자매의 어깨에 짊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는 개인의 삶으로서도 안타깝지만, 국가적 손실이 될 수도 있다. 적어도 비장애형제자매들이 한 자리에 모여 그들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요구를 하나로 모아 지원이 마련될 수 있는 첫 단추부터가 시급히 요구되는 이유이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