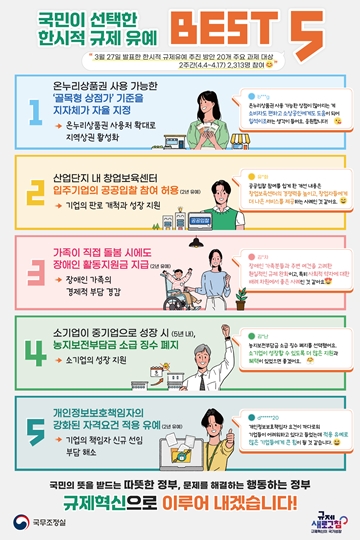【에이블뉴스 조현대 칼럼니스트】 제도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는다면, 과연 그것이 옳다고 할 수 있을까. 현실을 외면한 제도는 공동체의 행복을 실현하는 수단이 아닌 오히려 공동체 구성원의 자유를 억압하는 도구로 전락하고 말 것이다.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기 위한 제도가 ‘방해’가 된다면, 우리는 그 제도를 다시 들여다봐야 한다. 장애인활동지원제도가 그렇다.
장애인활동지원제도는 2011년 5월부터 시행되었다.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일상과 사회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의 자립을 돕고, 가족의 돌봄 부담을 줄여주는 취지로 도입됐다. 이후 지원 대상자와 지원 시간 확대, 급여 등 여러 측면에서 지속적으로 개선이 이루어졌지만 직계 가족은 활동지원 제공자 자격에서 배제되어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사실혼을 포함한 배우자, 형제자매, 직계가족, 시어머니, 시누, 사위, 며느리 등은 활동지원 서비스 제공이 허용되지 않는다. 단 도서산간 거주로 활동지원사를 구하기 힘든 경우, 천재지변이나 감염 위험이 있는 경우 가족 돌봄이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문제는 중증‧발달장애인이 활동지원사를 구하지 못해 불편을 겪는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일부 이용자는 적게는 6개월, 많게는 1년 이상 활동지원사를 찾지 못해 일상생활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설사 구한다고 해도 공격성이 심하거나 보호자의 부재에 극도의 불안감을 드러내는 경우 그 가족이 곁을 지켜야 하는 경우도 있다. 그렇게 되면 활동지원사는 직장을 그만둘 수밖에 없는데, 사실상 소득 공백으로 생계 위협까지 받는 셈이다.
용인에 거주하는 맹학교 후배 역시 6개월 동안 활동지원사를 구하지 못해 많은 불편을 겪었다. 지방 특성상 교통이 불편하고, 이용자가 원하는 대필이나 인터넷 검색 등의 작업을 도와줄 인력을 찾기 어려웠다. 활동지원사 대부분이 인터넷 작업이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이 많았던 탓이다. 그의 경우 동생과 조카가 곁에 있었지만, 현 제도상 가족이 직접 활동지원을 할 수 없어 아쉬움이 컸다.
가양동에 거주하는 맹학교 지인 또한 아직 활동지원사를 구하지 못하고 있다. 성향이 까다롭다는 점도 있지만, 음식이나 청소 서비스의 질이 맞지 않고, 인터넷 관련 작업도 제대로 지원받지 못해 결국 서비스를 포기한 상황이다. 만약 가까운 가족이 활동지원을 할 수 있었다면 이 같은 문제는 쉽게 해결됐을 것이다.
수원에 사는 또 다른 맹학교 동기는 부부 모두 중증장애인이다. 이들은 활동지원 시간으로 500시간을 배정받았지만, 이후 기존 활동보조인이 떠나면서 4개 센터에 지원을 요청했음에도 적합한 지원사를 찾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부모나 자녀 등 직계가족이 활동지원을 해줄 수 있다면 문제를 훨씬 수월하게 풀 수 있었겠지만, 현 제도는 이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
그간 많은 장애인과 그 가족들은 직계가족도 활동보조가 가능하도록 지원자격을 늘리는 주장을 지속적으로 해 왔다. 물론 반대의 목소리가 존재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하지만 부정수급 우려가 있다면, 제도 보완과 철저한 모니터링을 통해 이를 방지하면 될 일이다.
현재도 많은 최중증 장애인이 활동지원사를 구하지 못해 제도를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이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가까운 가족이나 친척이 활동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제도적 길이 하루빨리 열려야 할 것이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